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허경무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봄이 되어 중간고사와 벚꽃의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SNS를 봐도 꽃이 만발한 풍경 사진이나, 꽃나무 아래에서 화사함을 잔뜩 뽐내는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득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저런 소식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이번 게시글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는 SNS의 변천사 -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은 현재 SNS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인스타그램을 한참이나 보며 시험공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ㅎㅎ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보다보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친구들이 너무나도 멋진 일상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 인생사진도 남기고, 어딘지 모를 곳에서 맛있어보이는 것도 잔뜩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내심 속상해지기도 하고,
추천으로 뜨는 유머 게시물들을 보다보면 광고 투성이이고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정신없이 보다보면 한 두 시간씩 지나있어서 왠지모를 억울함이 잔뜩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상한 마음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SNS를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저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싸이월드,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사람들의 SNS
여러분은 SNS를 언제, 무엇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저는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하던 무렵부터였습니다.
싸이월드는 각자에게 '미니홈피'라는 개인 공간을 주고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곳이었습니다.
'미니홈피'라는 이름에 걸맞게, 번거로운 홈페이지 제작의 기술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나만의 홈페이지를 가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제 지인과 '일촌' 관계를 맺었고, 사실상 오프라인 관계의 연장선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명록'과 거기에 딸린 댓글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고, 주기적으로 서로의 방명록에 안부를 물어주는 '일촌 파도타기'도 유행했었죠.

이 시절엔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고, 저작권 개념부터 익명성 개념은 물론이고 잊힐 권리 따위는 대다수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허울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추억(이라 쓰고 흑역사라 읽는 것)을 잔뜩 남겼고, 그 당시 생성되는 컨텐츠는 대부분 각자가 생산한 오리지널 컨텐츠였습니다.
'사진첩'에는 정말로 자신의 사진첩에나 담을 만한 사진들을 올렸고, 게시판에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멋진 생각(또는 똥글) 같은 것들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적어도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만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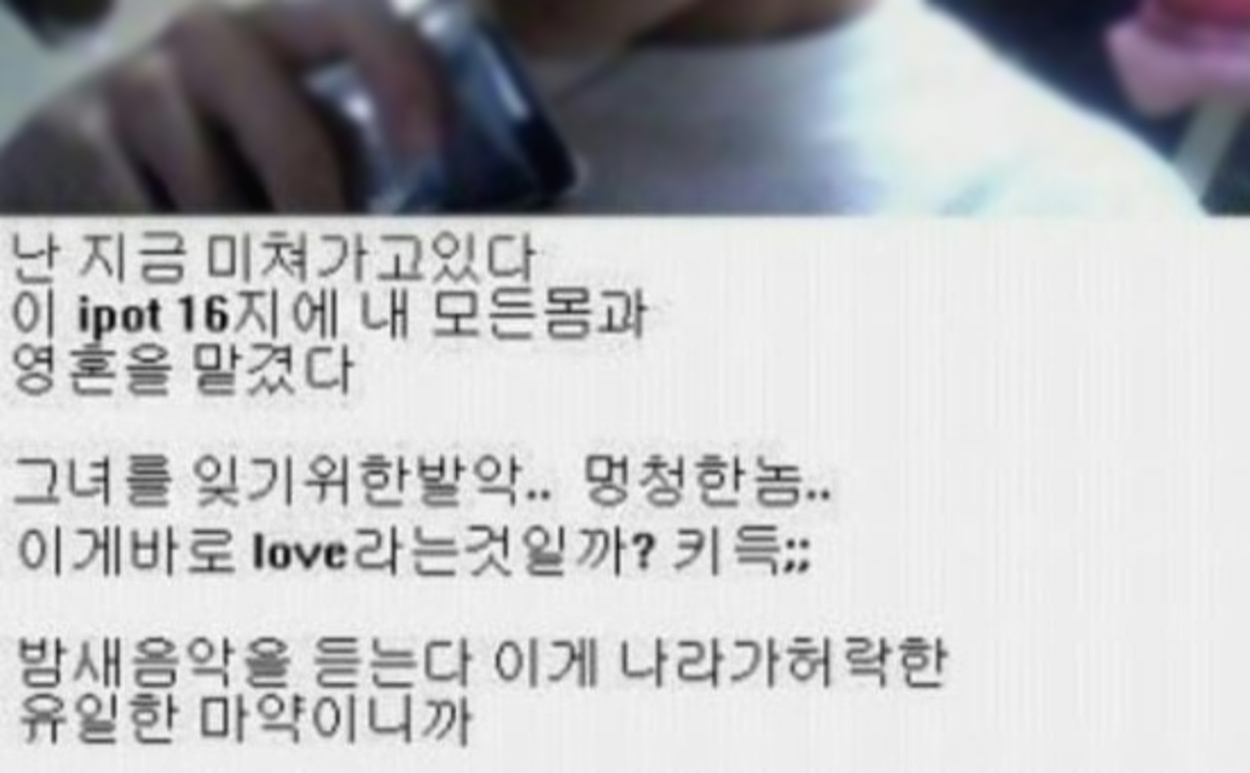
'내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가 먼저 보이는 페이스북
그러나 미니홈피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페이스북에게 밀려 유행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니홈피와 비교하면, 페이스북은 확연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공간'이 중심이었던 미니홈피와 달리, 싸이월드는 '남들과의 소통'이 중심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실행하면 처음 보이는 '뉴스피드' 화면은 내 친구들의 최신 소식이었죠.
이때부터 SNS의 괴로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좀 짧아졌고,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고, 그전까지는 번거롭던 사진 첨부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보다 면밀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던 '카페인 우울증'(SNS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란 카카오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증세입니다.
SNS에 올린 자기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고, 좋아요 갯수에 집착하고, 남들의 행복한 소식에서 상대적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죠.
저 역시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런 우울감을 느꼈고, 점차 무언가 쓰기보다는 남의 소식만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의 세계가 점차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오리지널 컨텐츠'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현상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자기검열도 주요한 이유가 됐을 것이고,
미니홈피처럼 자신의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을 수 없는 페이스북의 시스템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주변 사람들이 점차 뜸해질 즈음, 저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인스타그램

시간은 흘러 몇 년 후, 간식행사 소식을 미리 알지 못해 눈앞에서 햄버거를 놓친 저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며 SNS세계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학생회, 동아리, 심지어는 학교의 공식 행사까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온 SNS의 세계는 한층 더 낯선 공간이 되어있었습니다.
추천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인플루언서나 인스타 얼짱들의 사진들이 끝없이 나오고, 그보다 더 많은 유머 계정, 컨셉 계정의 저급한 컨텐츠들은 꿀팁으로 위장한 저마다의 개인 광고물을 끼워넣기 바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 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머, 가십 구독 어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소식으로 시끌벅적하면서도 막상 소통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SNS의 광장 한 가운데에서, 저는 문득 그 시절 저마다의 이야기를 남기던 수다스러움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하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더이상 서로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된 SNS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SNS는 없어도 SMS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던 시절의 소통이 오히려 활발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의 장은 넓어졌지만 막상 소통의 의욕은 상실되고 있는 세상,
길지 않은 SNS의 변천사의 한쪽 끝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 있는 것일까요?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는 전혀 다른 SNS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SNS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저 혼자만일지도 모르고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